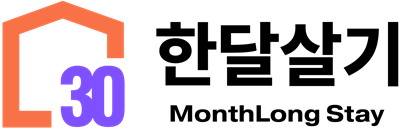고온다습한 날씨와 함께 시작된 이 여정은,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삶의 또 다른 결을 느껴보고자 하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 애틀랜타는 처음부터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길, 고층 빌딩과 녹음이 어우러진 풍경은 이 도시가 남부의 여유로움과 대도시의 활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내가 머문 곳은 교외 지역인 Sandy Springs였다. 번잡한 도심과는 달리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 30분 내외의 거리로 일정을 소화하고 다시 고요한 생활로 돌아오는 루틴이 생겨났다. 조용한 일상과 도시적 활기 사이를 오가는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피드몬트 파크와 차타후치 리버 같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짧은 피크닉은 이 도시가 가진 소박한 여유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음식 문화는 이곳이 단조로운 듯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향취를 품고 있음을 보여줬다. Buckhead에서 맛본 진짜 남부식 BBQ는 강렬했고, Duluth의 한국 음식점들은 이국적인 속에서 느끼는 익숙함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도시의 모든 풍경이 신선함으로 다가왔던 건 아니다. 일정한 리듬과 분위기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하루가 조금씩 비슷하게 느껴졌다. 예상 가능한 교통 체증, 반복되는 상업 지구의 구조, 친절하지만 정형화된 서비스는 다양함 속에 깃든 단조로움을 드러냈다.
애틀랜타 바깥의 도시 사바나는 또 다른 인상을 남겼다. 조지아 남부의 항구도시이자 고풍스러운 건축과 드리운 스페니시 모스가 인상적인 그곳은, 짧은 여행이었지만 마치 한 장의 수채화를 걷는 듯한 경험으로 남았다. 무더운 날씨와 다소 건조한 지역민들의 태도는 아쉬웠지만, 도시에 대한 좋은 느낌이 더 컸던 것 같다.
한 달 동안 애틀랜타에서 보낸 시간은,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밋밋하지도 않은, 묘하게 균형 잡힌 흐름 속에 있었다. 지인을 통해 참여하게 된 테니스 모임은 나에게 현지 한인들의 삶과 온도를 체감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마지막 날, 다시 찾은 피드몬트 파크. 잔디밭에 앉아 도시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나는 애틀랜타를 복기했다. 이곳은 눈부시진 않지만 은근히 마음에 스며드는 도시였다.
여행지로서의 화려함은 없지만, 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상의 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삶을 상상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든 곳. 그게 아마도 애틀랜타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다.
달동네 방랑객